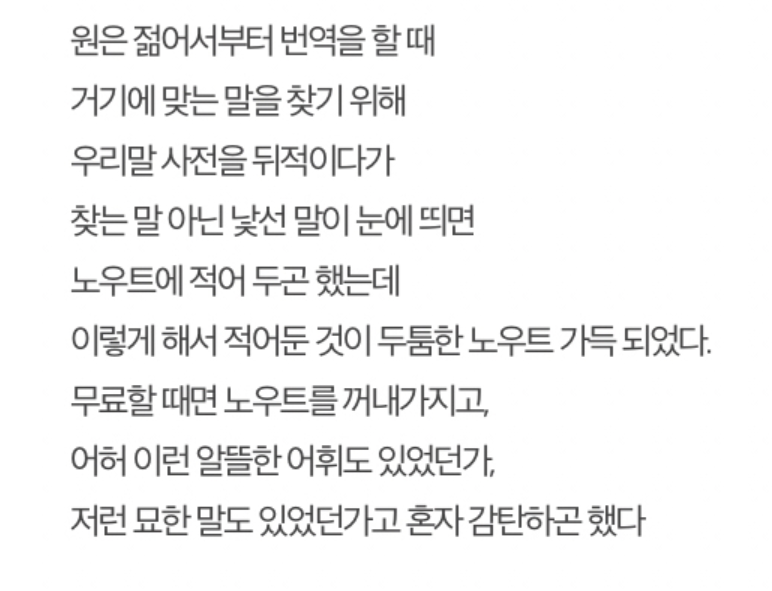"원응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red
(→황순원과의 관계, 일화) |
|||
| 66번째 줄: | 66번째 줄: | ||
선생은 주석에서 친구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면서 꼭 병바닥의 마지막 잔 술을 탁자 옆 허공이나 퇴주그릇에 부었는데, 그것을 아는 제자들은 덩달아 그 법칙을 지켜가며 숙연해 하곤했다. | 선생은 주석에서 친구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면서 꼭 병바닥의 마지막 잔 술을 탁자 옆 허공이나 퇴주그릇에 부었는데, 그것을 아는 제자들은 덩달아 그 법칙을 지켜가며 숙연해 하곤했다. | ||
| + | |||
| + | |||
| + | |||
| + | *소설가 김수영: 박태진의 소개로 원응서 씨를 찾아갔을 때 문화예술사의 편집실에서 그를 처음 보았다. 풀이 죽은 회색빛 래글런 오버에 거무죽죽한 회색 중절모를 쓰고 창문 앞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다. 나는 첫눈에, '저 치도 나만큼 가난하고 나만큼 고독하고 나만큼 울분이 많고 나만큼 뗑깡이 심한 치겠두나.' 하고 느꼈다. 그 후 얼마 있다가 자유시장에서 우연히 그를 만났는데 그는 어떻게 나를 알았던지 다짜고짜로 내 팔을 끌고 술집으로 데리고 가서 소주를 마구 마시더니, 내가 안내한 찻집에 가서는 내 입에다 미친 듯이 입을 맞추면서 창가에 늘어놓은 화분의 화초를 모조리 뿌리째 뽑아 내꼰쳤다. | ||
2020년 6월 24일 (수) 13:25 판
인물
평양 출생 번역문학가. (1914-1973)
업적
- 1914년 평양 출신의 원응서는 한국전쟁 때 월남한 월남하였다.
- 리쿄 대학 영미 학부를 졸업했고, 1.4 후퇴 때 월남하였다. 문예지 <문학의 주간>을 역임하였고, 번역 이외의 일에는 별로 활동을 하지 않은 인물. 번역 작품으로는 <나의 사랑 안드리스>, <제인 에어>, <25시> 등이 있다.
- 원응서의 《황금충》은 국내에서 최초로 출판된 에드거 앨런 포 소설집인 데에다가 화가 이중섭의 솜씨로 장정된 책이다.
원응서의 《황금충》에는 에드거 앨런 포의 단편소설 8편이 실려 있다.
첫 번역 치고도 대표작을 고루 번역해서 모았다. 속표지에는 [포 소설집]이라고 되어 있고
영문으로 뉴욕 맥밀란 출판사에서 나온 1953년판을 번역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추리소설의 역사에서도 기념비적인 번역이며, 이중섭 장정이라는 사실로도 돋보이는 책이다.
<황금충>의 장정을 맡은 이중섭은, 에드가 엘런 포의 작품에 흐르는 죽음의 공포감, 불쾌감, 우울의 이상, 괴기미 등을 표지의 앞뒷면에 걸쳐 그의 붓결로 나타내었다.
<황금충>은 원응서가 중앙출판사 대표로 있을 때 자기 회사에서 출판한 책인데 그 장정을 이중섭에게 맡겼다.
<황금충의 표지>
- 1954년에 극작가 오영진이 창간한 <문학예술>에 참여했다. 함께 참여한 주요섭, 박남수, 김이석은 모두 평양 태생의 월남 문인이다.
황순원과의 관계, 일화
- 원응서와 황순원은 절친한 사이였다.
소나기의 결미에 원래의 원고에서는 소년이 신음소리를 내며 돌아눕는다는 끝 문장이 있었는데, 절친한 친구 원응서 선생이 그것은 사족이니 빼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은 <목넘이 마을의 개>에서도 유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좋은 친구요 좋은 독자를 가진 복을 누린 경우이다
- 문학평론가 김종회: 황순원은 1951년 두 번째 작품집 <기러기>를 간행하였는데, 여기에 실린 대다수의 작품들은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일제의 한글 말살 정책으로 발표되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석유 상자 밑이나 다락 구석에 틀어 박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었다. 월남 전의 황순원은 평양 기림리의 집에서 술상을 가운데 놓고 절친한 친구 원응서에게 작품을 낭독해 주곤 했다. 당시 유일한 독자였던 셈이다.
- 황순원은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 원응서와의 교감을 그린 <마지막 잔>(1974)이라는 단편을 쓰기도 하였다. 황순원은 주석에서 친구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면서 꼭 병바닥의 마지막 잔 술을 탁자 옆 허공이나 퇴주그릇에 부었는데, 그것을 아는 제자들은 덩달아 그 법칙을 지켜가며 숙연해 하곤했다고 한다.
- 제자 김종회 교수가 기억하는 바 황순원은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사고나 따뜻하고 순후한 인간애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면모는 작품세계 가운데서도 처처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 원응서와의 교감을 그린 <마지막 잔>(1974)이 있다.
선생은 주석에서 친구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면서 꼭 병바닥의 마지막 잔 술을 탁자 옆 허공이나 퇴주그릇에 부었는데, 그것을 아는 제자들은 덩달아 그 법칙을 지켜가며 숙연해 하곤했다.
- 소설가 김수영: 박태진의 소개로 원응서 씨를 찾아갔을 때 문화예술사의 편집실에서 그를 처음 보았다. 풀이 죽은 회색빛 래글런 오버에 거무죽죽한 회색 중절모를 쓰고 창문 앞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다. 나는 첫눈에, '저 치도 나만큼 가난하고 나만큼 고독하고 나만큼 울분이 많고 나만큼 뗑깡이 심한 치겠두나.' 하고 느꼈다. 그 후 얼마 있다가 자유시장에서 우연히 그를 만났는데 그는 어떻게 나를 알았던지 다짜고짜로 내 팔을 끌고 술집으로 데리고 가서 소주를 마구 마시더니, 내가 안내한 찻집에 가서는 내 입에다 미친 듯이 입을 맞추면서 창가에 늘어놓은 화분의 화초를 모조리 뿌리째 뽑아 내꼰쳤다.